“납품 끊더니 그대로 베껴 팔았다” 기술 탈취의 민낯

중소기업이 수년간 연구개발 끝에 완성한 기술이 하루아침에 대기업의 손으로 넘어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납품 계약을 맺고 기술 자료를 제공했더니, 어느 순간 거래는 끊기고 유사 제품이 대기업의 브랜드로 시장에 풀리는 식이다. 피해 기업은 공정위 신고와 소송으로 맞서지만, 결과는 ‘과징금만 내고 생산은 계속’ 혹은 ‘몇 년 싸운 끝에 푼돈 배상’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2015년, 한 선박용 공조기 제조업체는 외부 빗물과 파도의 유입을 차단하는 대환기구 장치를 개발했다. 이후 국내 1위 선박용 장비업체 하이에어 코리아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제품을 납품했으나, 몇 년 지나지 않아 주문이 끊겼다. 조사 결과, 하이에어 코리아가 해당 장비를 자체 생산해 납품하고 있었던 것이다. 공정위는 기술 도용과 보복 행위를 확인하고 과징금 26억 4천만 원을 부과했지만, 하이에어 코리아는 행정 소송을 제기해 시정 명령을 멈춰 세웠다. 결국 과징금만 낸 채 같은 제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 피해 업체는 공정위 결론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없는 현실에 “더는 기술 개발 의지가 사라졌다”며 절망감을 토로했다.

태양광 장비 업체 SJ이노테크의 사례도 비슷하다. 2011년 한화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핵심 도면을 넘겼지만, 계약 종료 후 한화가 유사 제품을 자체 생산해 계열사에 공급했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기술 무단 사용이 인정돼 10억 원 배상 판결을 얻어냈다. 그러나 한화는 즉시 상고했고, 소송은 9년째 이어지고 있다. 수억 원에 달하는 소송 비용은 중소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증거 확보의 장벽’이다. 기술 탈취를 입증할 핵심 자료는 대부분 가해 기업이 쥐고 있다. 피해 기업은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접근조차 할 수 없다. 손해 배상 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도용 의혹을 받는 쪽에 있지만,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사실상 방법이 없다. SJ이노테크가 항소심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것도 수년간 끈질기게 신청한 끝에 제품 부품 리스트 일부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 업체 솔컴 인포컴스 역시 코오롱 IT 계열사에 프로그램을 납품하다 기술을 빼앗겼다. 8년간 소송 끝에 받아낸 배상액은 고작 2천만 원. 청구 금액 대비 17% 수준이었다. 결국 회사는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기술 탈취 피해 기업이 법원에서 인정받는 평균 배상액은 청구액의 17.5%에 불과하다.
정부도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섰다. 손해 배상액 산정에 개발 비용을 포함시키고, 전문기관이 손해액을 추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행정기관의 자료 제출 명령권도 신설된다. 정부는 국회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의 불신은 여전하다. 수년간의 소송 끝에 남는 건 빚과 상처뿐이라는 회의감 때문이다. “개발하면 빼앗기고, 소송하면 망한다”는 말이 중소기업 사이에서 회자되는 현실.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말뿐인 약속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보호 장치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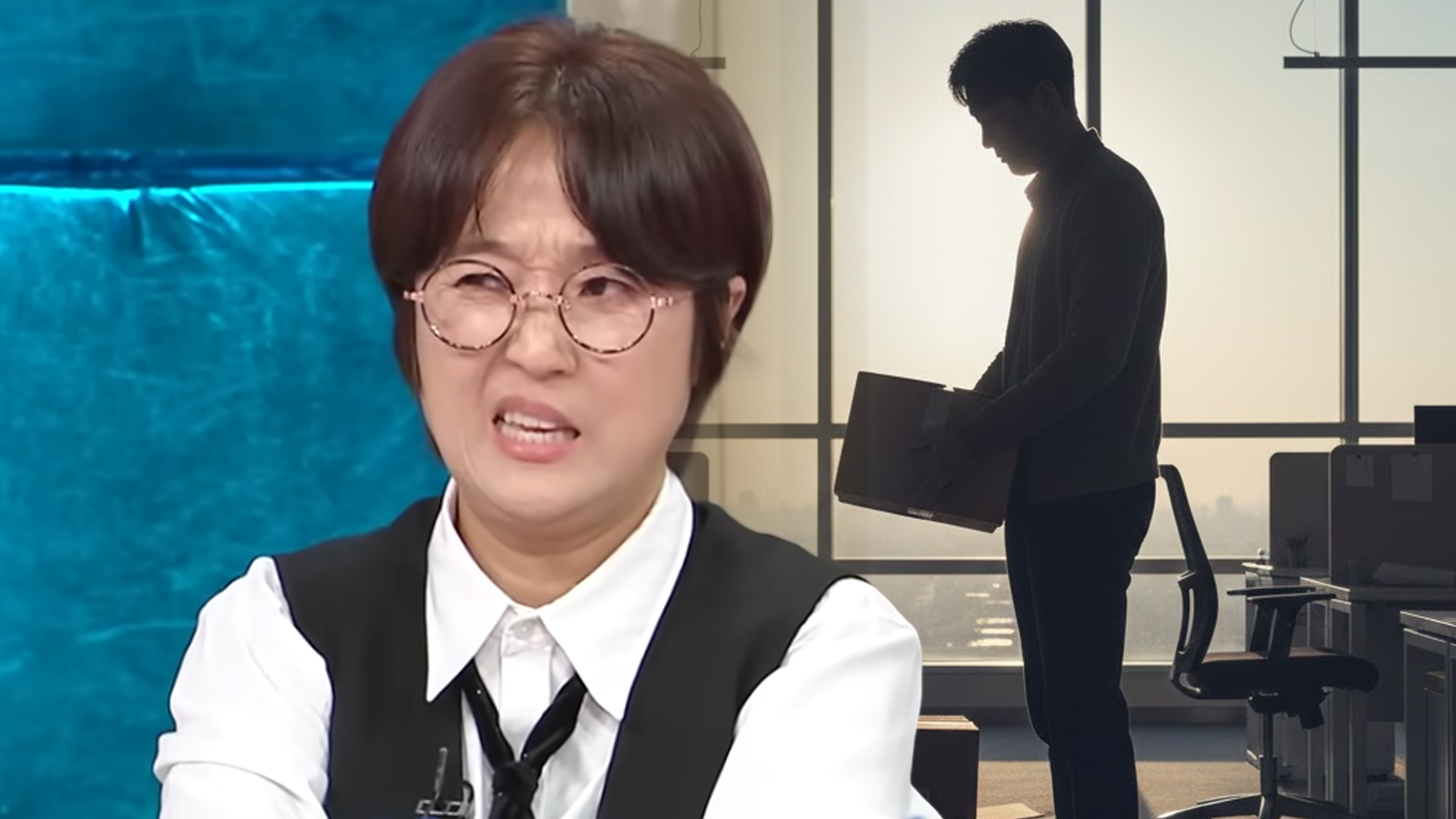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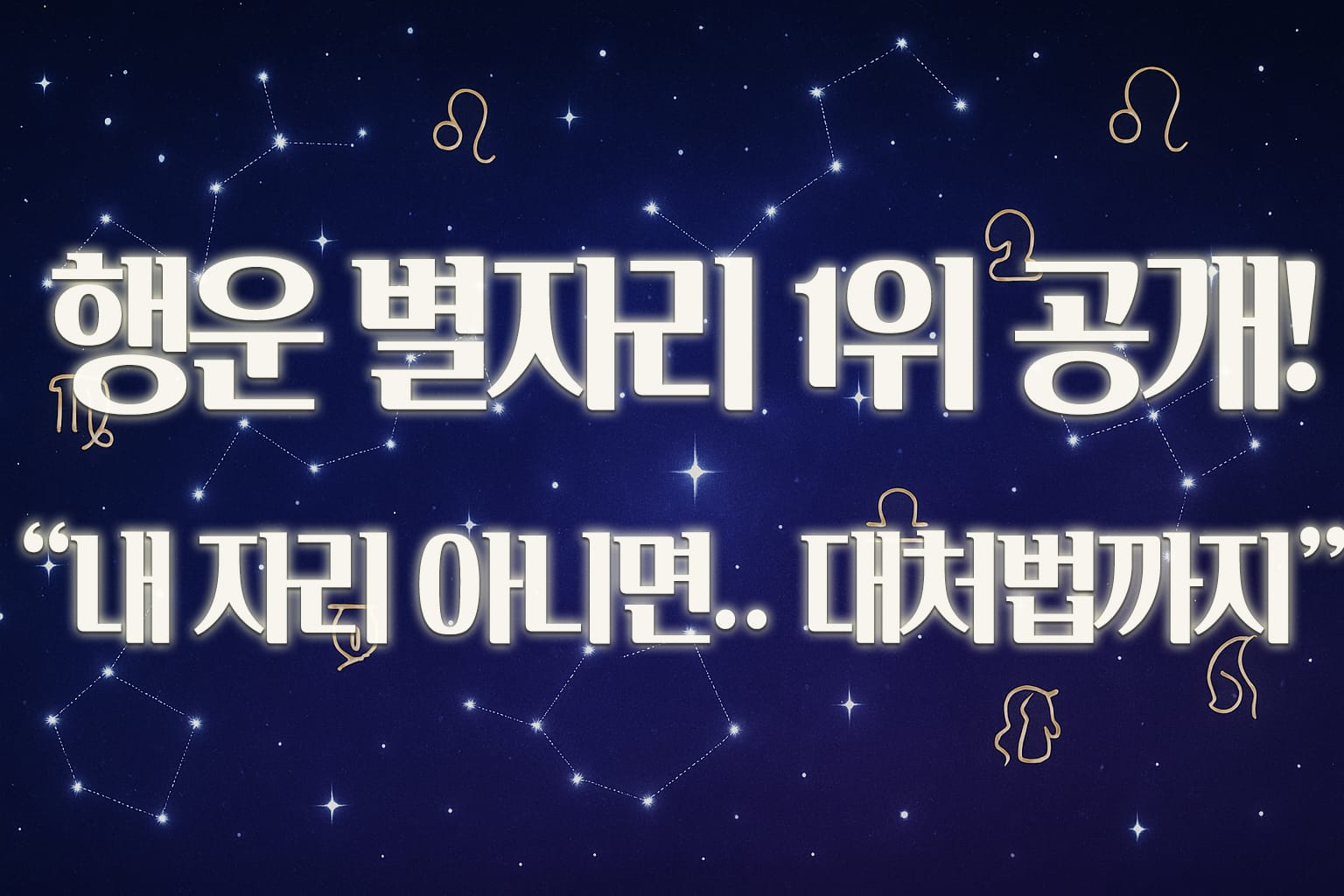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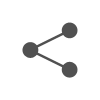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