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싶으면 1년 기다려라” 맥립이 만든 지독한 결핍의 경제학

한때 맥도널드의 주방은 맥너겟 때문에 아수라장이었다. 1980년대 초, 미국 전역이 너겟 열풍으로 들썩이자 닭고기 수급이 바닥났다. 맥도날드는 대안을 찾아야 했다. 룩셈부르크 출신 셰프 르네 아렌드가 여기서 등장한다. 그는 미국인이 사랑하는 바비큐 립에 꽂혔다. 하지만 진짜 갈비는 비싸고, 뼈 때문에 먹기도 번거롭다. 그래서 ‘맥너겟 제조 경험’을 뒤집어 썼다. 돼지 어깨살을 곱게 갈아 패티로 만들고, 금형으로 ‘갈비뼈 모양’에 찍어냈다. 이렇게 맥립이 태어났다.
1981년, 전국 매장에 깃발 꽂듯 진열. 반응은… 미지근했다. 미국 소비자는 패티 모양도, 끈적한 바비큐 소스도 낯설었다. 매대 앞에서 한 번 더 망설이게 만드는 비주얼. 반전은 독일에서 터졌다. 돼지고기 선호 문화가 받쳐주니 맥립이 쑥쑥 팔렸다. 그래도 본진인 미국에선 1985년 결국 단종. 여기까지만 보면 ‘실패한 실험’ 같지만, 이때 마케터들이 인간 심리의 급소를 본다. 없는 게 더 먹고 싶다. 바로 그 ‘결핍’.

그다음 전략은 단순했다. 연중 판매? 철회. ‘가을 한정’으로만 풀었다. “지금 안 먹으면 1년 기다려야 함.” 이 한 줄이 구매 버튼을 눌렀다. 2005년엔 아예 ‘이별 투어’까지 돌렸다. ‘영원히 사라진다’는 메시지를 뿌리자 매장에 줄이 생겼다. 그리고 또 돌아왔다. 또 이별. 또 재회. 반복될수록 맥립은 메뉴가 아니라 이벤트가 됐다. ‘맥립 뜨는 계절’이 생겼고, 그 계절을 기다리는 팬덤이 생겼다.
이쯤 되면 맥립은 음식이 아니다. 경험이다. 어떤 사람들은 맥립을 찾아 수백 킬로미터를 달리고, 어떤 팬들은 냉동실에 쟁여 1년을 버틴다. 먹는 건 10분이지만, 기다림과 공유는 1년 내내 이어진다. 맥도날드가 파는 건 돼지고기 샌드위치가 아니라 ‘희소성에 대한 욕망’과 ‘기다린 끝의 만족’이라는 주장, 충분히 설득력 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붙는다. ‘돼지고기 가격 연동설’. 시장 쪽 사람들은 시카고 상품거래소 데이터를 들이민다. 돼지고기 선물 가격이 저점으로 내려가는 구간, 그 시기에 맥립이 자주 돌아온다는 주장이다. 원가를 줄이고 이익을 키우려는 타이밍 플레이라는 해석. 맥도날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수십 년간의 판매 시점과 그래프를 나란히 놓아 본 이들 사이에선 여전히 회자된다. 진실이 뭐든, ‘합리적인 의심’이 또 하나의 바이럴이 된 건 분명하다.

결국 맥립의 역사는 이렇게 요약된다. 너겟 대체재로 태어났다. 본국에선 초반에 미끄러졌다. 그 실패가 ‘한정판 전략’으로 뒤집혔다. 팬덤이 붙었고, 출시는 시즌 이벤트가 됐다. 그 사이 브랜드는 ‘메뉴’가 아니라 ‘이야기’를 팔았다. 이 한 편의 케이스 스터디는 지금도 수많은 브랜드의 한정판 마케팅에 복제되고 있다. 상품의 성능이 비슷해질수록, 사람들은 스토리와 리추얼을 산다. 맥립은 그 공식을 가장 맛있게 증명한 사례다.
- 남편은 무기징역, 아내는 부정축재에 살인혐의로 사형…막장 정치인 부부
- 비밀 연애중이던 성당 신부가 여친 몰래 유부녀와 바람피우더니 결국…
- 얼마전까지만 해도 국민 스타였는데…결국 징역형 선고받은 여배우
- 하마스 100명을 사살해 난리난 이스라엘 여군특수부대의 정체
- 백종원 지속된 폐업이어 결국 마지막 희망인 ‘이 사업’ 마저 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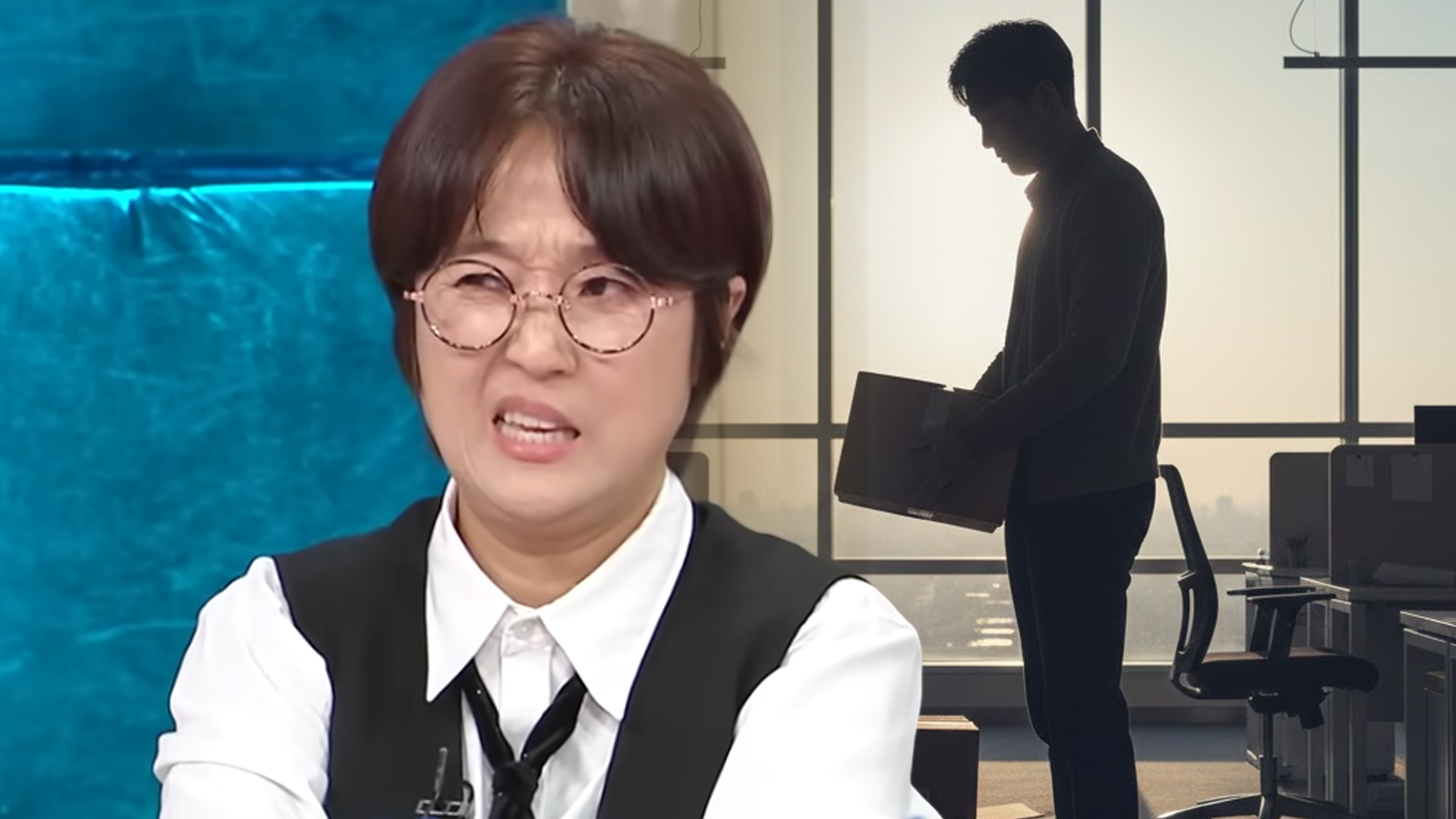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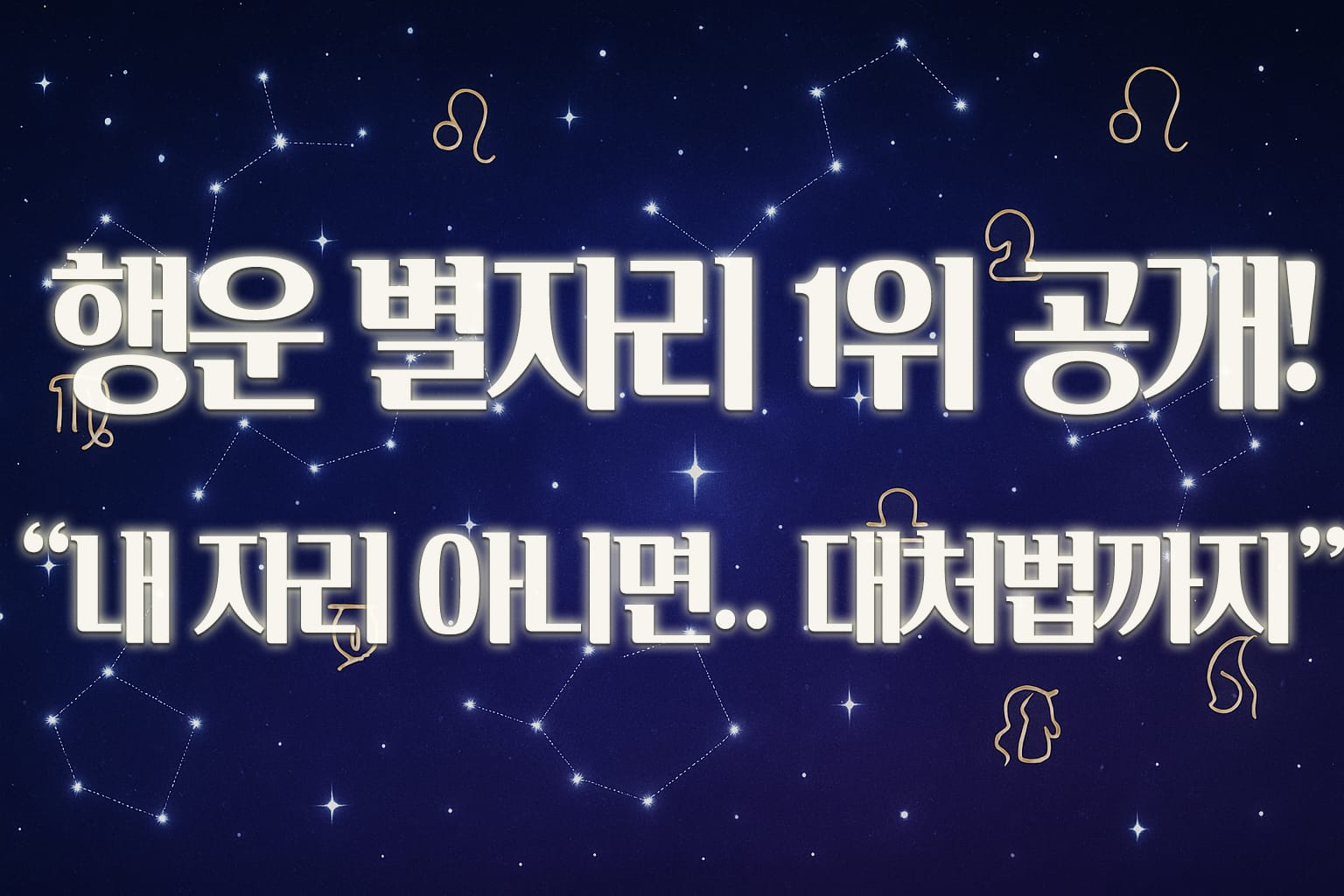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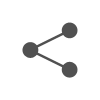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