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두려워한 생태계 파괴범, 한국에선 맛집 주인공

전 세계가 퇴치에 골머리를 앓는 ‘생태계 파괴범’이 한국에 오자, 단숨에 ‘밥도둑’이 되어버렸다. 그 주인공은 바로 톱날꽃게다.
톱날꽃게는 원래 서태평양 연안에 서식하는 외래종으로, 뉴질랜드와 호주에서는 공포의 대상이다. 물고기, 조개, 심지어 다른 게까지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식성에 한 번에 수십만 개의 알을 낳는 번식력까지 갖췄다. 이 정도면 생태계를 교란시키기에 충분했다. 뉴질랜드와 호주는 수년째 이 종을 박멸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잡을수록 번식하고, 막을수록 퍼졌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외래종이 한국 바다에 나타났고, 우리나라의 환경단체들도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하자고 논의하던 찰나, 한국인들이 움직였다.
“이거, 먹을 수 있겠는데?”
먹어 본 사람들에 의해 ‘톱날꽃게가 단맛과 감칠맛이 풍부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본격적인 요리 소재가 되기 시작했다. 꽃게탕, 꽃게장, 찜, 튀김까지.. 다양한 요리법에 찰떡궁합이었다. 바다의 골칫덩어리가 될 뻔한 외래 침입종이 어느새 식탁 위의 인기 메뉴로 변신했다.
이 현상은 해외에서도 화제가 됐다. 호주 언론은 “한국인들은 외래종조차 음식으로 정복한다”고 보도했고,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생태계 교란종마저 맛으로 제압했다”는 농담이 돌았다.

실제로 제주도 어민들은 톱날꽃게를 잡아 판매하며 소득원이 생겼고, 개체 수 역시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생태계 위협으로 분류됐던 종이, 한국에서는 오히려 자연 조절 메커니즘의 일부가 되었다.
1,500종이 넘는 식재료를 쓰는 한국인들의 다양한 식문화가 주는 의외의 순기능이다. 한국인은 그저 맛있고 몸에 좋으면 잡아 먹는다. 중국을 제외하고 식재료에 한계를 많이 두는 외국에서는 이런 발상은 쉽지 않다. 악명 높던 톱날꽃게는 한국인 식탁 위 젓가락 이라는 천적을 만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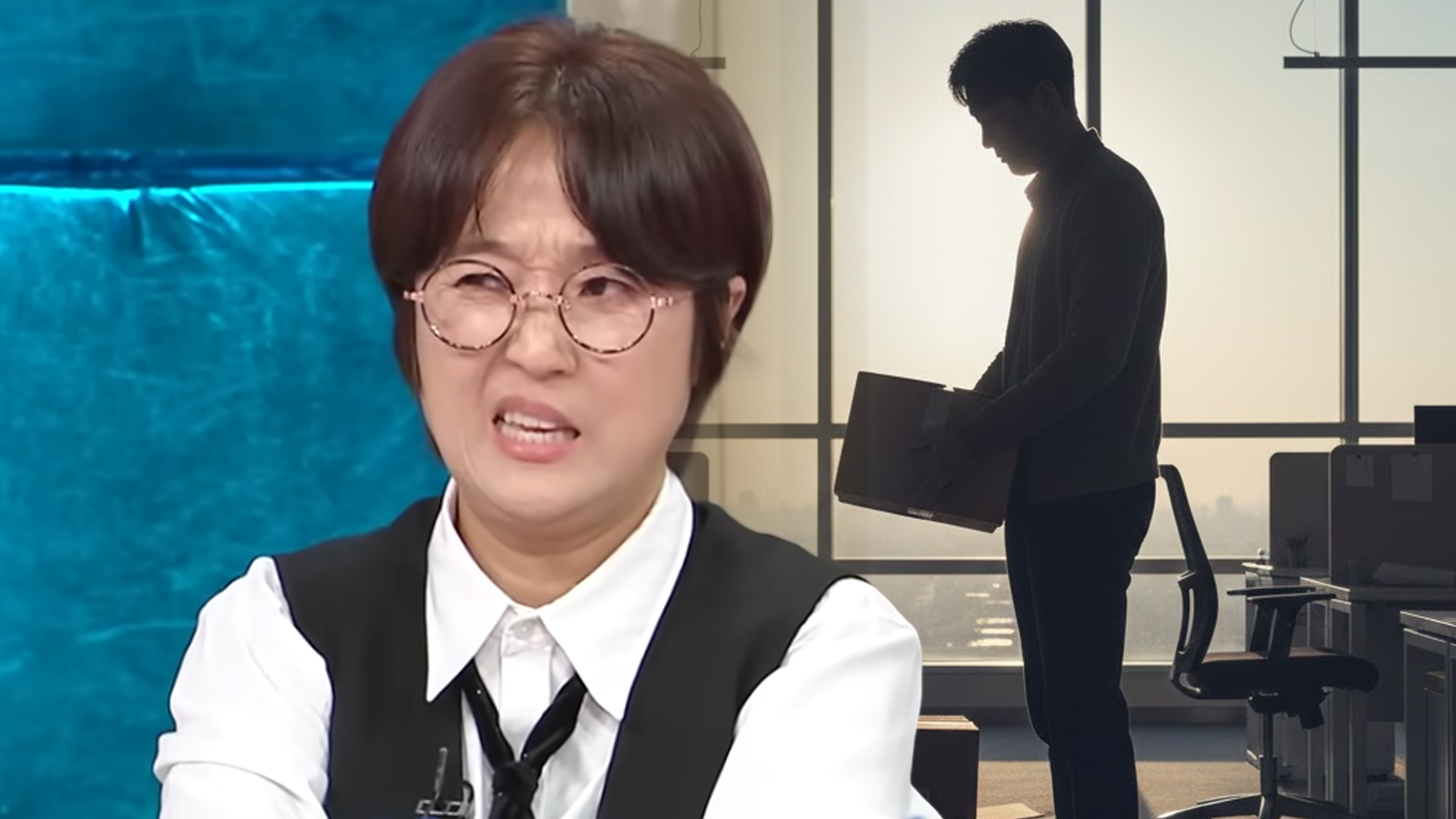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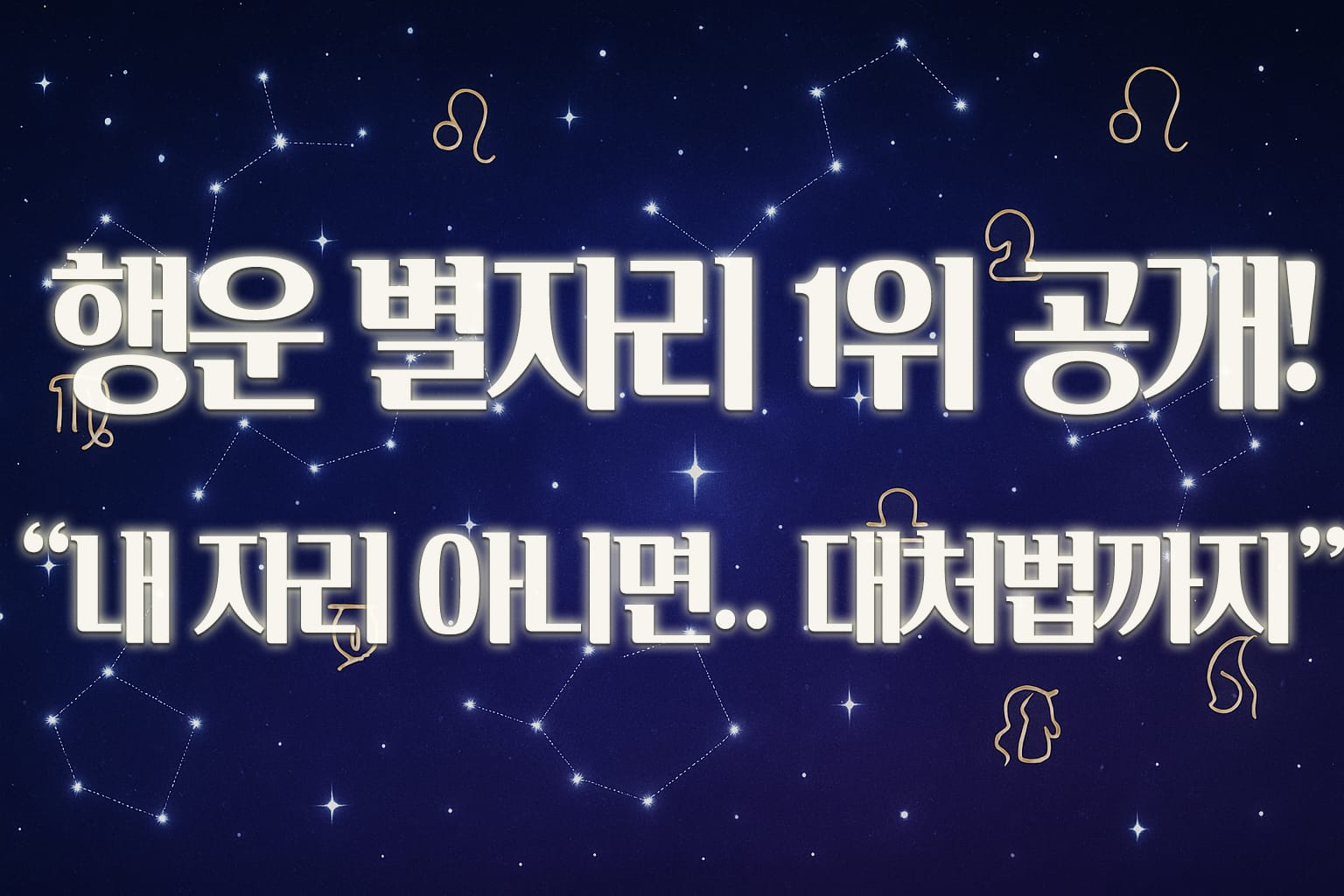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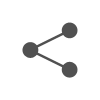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