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때 1,000원도 못 가져가요” 90대의 마지막 기부

새벽 어둠이 채 걷히기도 전, 허리 굽은 90대 노인이 골목길을 천천히 걷는다. 손수레에는 종이박스와 폐지가 수북이 쌓여 있다. 그런데 이 노인은 ‘생활고’가 아니라, ‘철학’ 때문에 폐지를 줍는다. 그녀의 통장에는 무려 15억 원이 있었다.
주인공은 길분예 할머니. 평생을 근검절약으로 살아온 그는 서울의 10평 남짓한 빌라에서 홀로 지내며, 70년 넘게 장사로 모은 돈을 모두 교육 기부금으로 내놓았다.

그녀가 기부한 금액은 현금과 부동산을 합쳐 약 15억 2천만 원. 그 돈은 단 한 푼도 가족이나 지인에게 가지 않았다. 오롯이 “가난 때문에 학교 못 가는 아이들이 없길 바란다”는 한마디로 귀결됐다.
길 할머니는 어려운 시절을 온몸으로 버텼다. 20대 초반에는 미나리 장사, 그다음엔 옷 장사와 쌀 장사를 하며 하루하루를 견뎠다. 가난한 이웃의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기도 했다. 자신은 새 옷 한 벌 없이 살았지만, 남이 굶는 꼴은 못 봤다. 그렇게 평생 모은 돈을 세어보니, 어느새 억 단위였다. 하지만 그 돈을 쓰는 데에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나는 학교를 못 다녀서 평생 글 한 줄도 제대로 못 썼어요. 나 같은 애가 또 생기면 안 되지요.”
그녀의 기부 이유는 단순했다. 배움에 대한 갈증,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순수한 책임감이었다.

길 할머니는 90세가 넘도록 스스로를 ‘국가의 빚쟁이’라고 불렀다. “이 나이까지 살 수 있었던 건 나라 덕분이다. 이제 돌려드려야지.”
그녀는 죽을 때 단돈 1,000원도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 담담히 받아들였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삶을 ‘주는 일’로 채워 넣었다.
폐지를 줍는 이유를 묻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라도 몸을 움직이면 아직 쓸모 있는 사람 같아서 좋아요. 돈이 많다고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때가 진짜 행복이지.”
그녀의 평생은 조용했지만, 그 울림은 크다.
세상은 종종 가진 이의 기부를 화려하게 포장하지만, 길 할머니의 기부는 말 그대로 ‘삶 자체가 기부’였다.
그녀의 손끝에서 구겨진 폐지가 교육의 씨앗으로 바뀌고, 그 씨앗은 또 다른 아이의 미래를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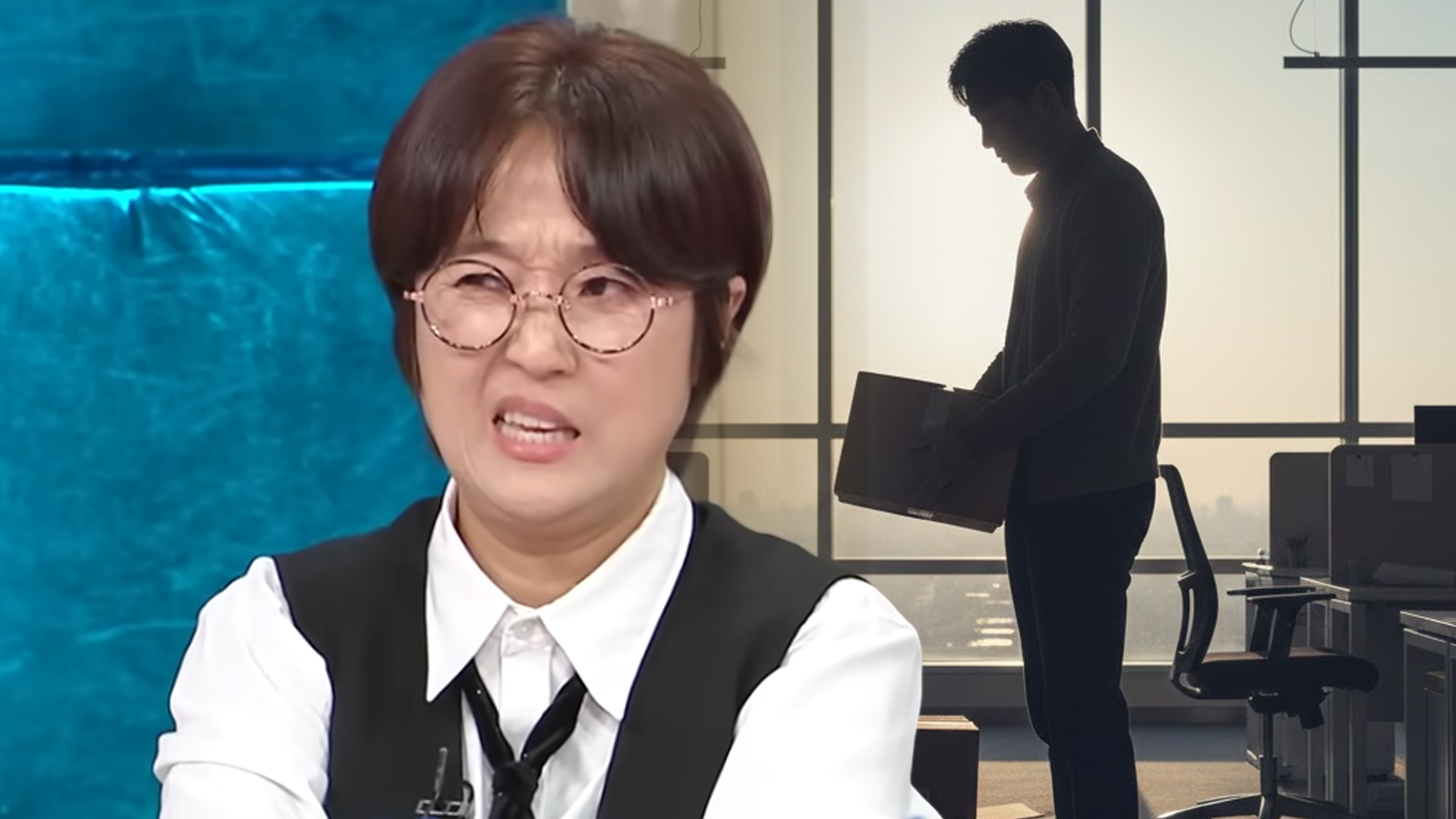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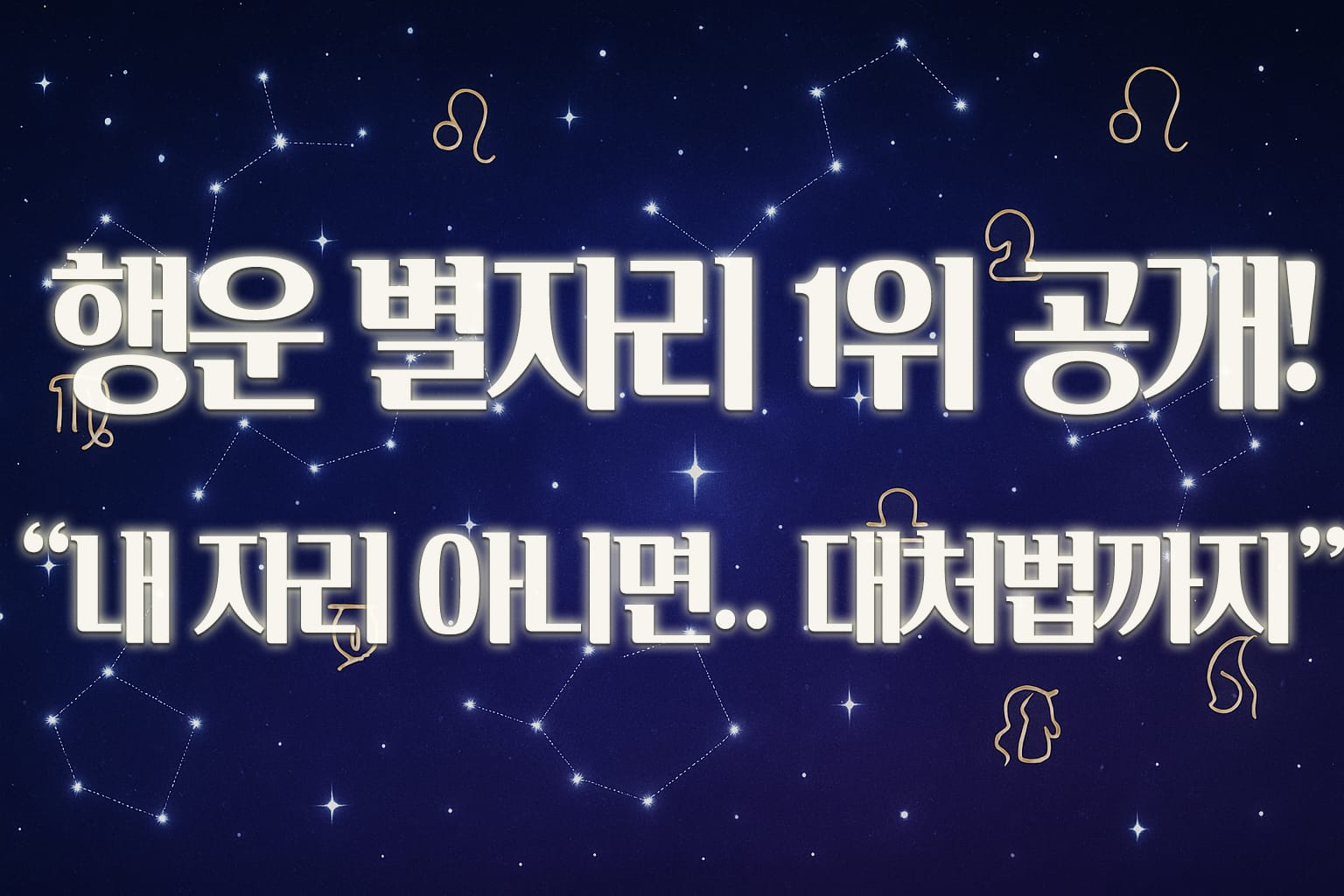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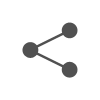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