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에서 독점 논쟁까지: 배민 신화의 값

2019년 겨울, “배민이 독일 회사에 팔렸다”는 소식이 돌던 날 한국 스타트업 씬은 얼어붙었다. 금액은 4조7천억 원. 국민앱이라 불리던 배달의민족이 딜리버리히어로 품으로 들어간다는 헤드라인은 축하가 아니라 배신감부터 불렀다. 한때 “한국의 구글”을 꿈꾼 디자인 출신 창업자 김봉진의 이야기, 전단지 몇 장에서 출발해 생활 인프라가 된 플랫폼의 이야기, 그 끝이 외국 자본과의 빅딜이라니. 시장은 즉시 계산을 시작했다.
요기요를 이미 가진 DH가 배민까지 품으면 사실상 독점 구도. 국회는 공정위 심사를 압박했고, 공정위는 길게 고민한 끝에 조건부 승인—요기요 매각을 전제로 딜을 통과시켰다. 서류상으론 정리됐지만 민심은 정리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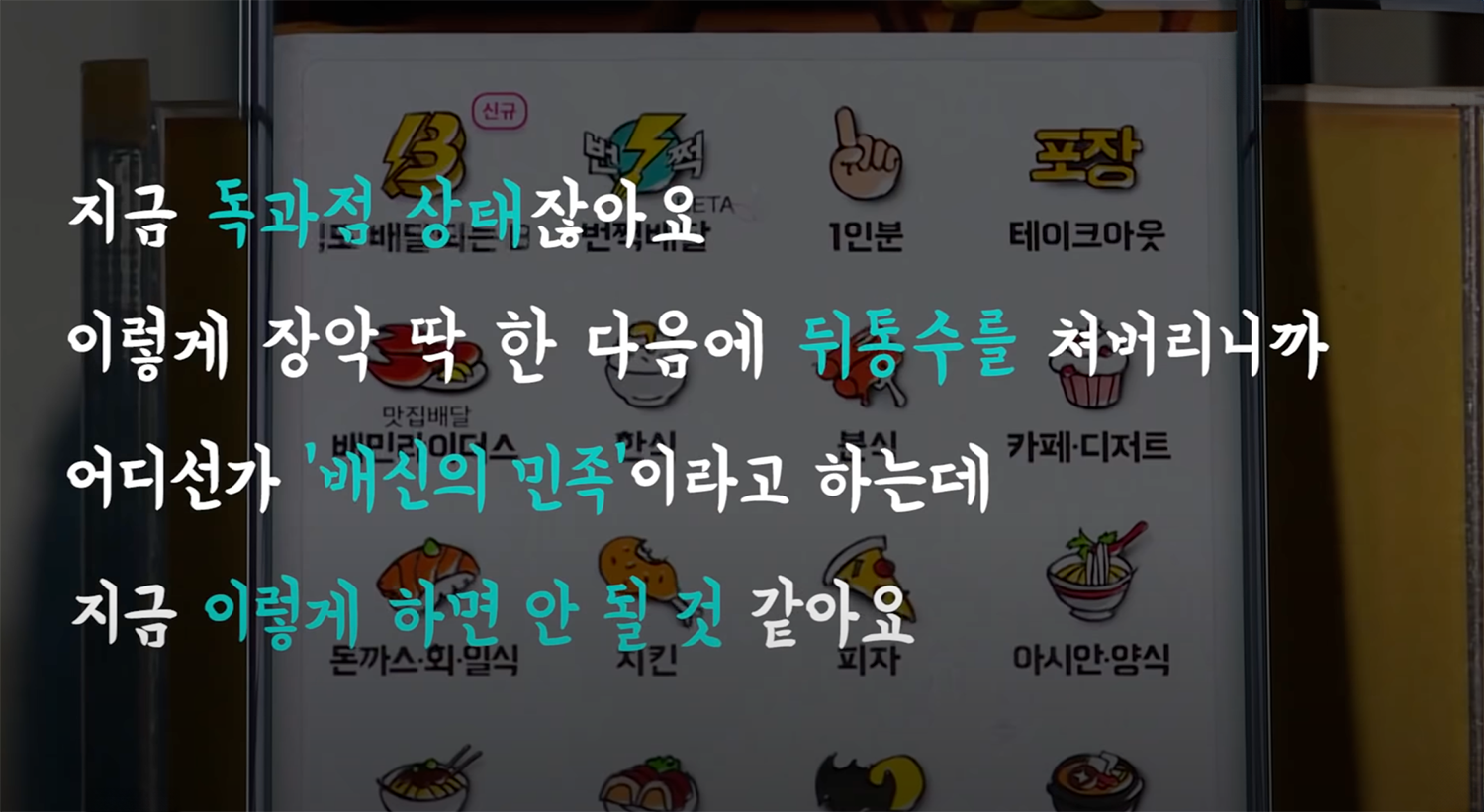
독점의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되었다. 사실상 강제가 되어버린 광고비용 및 수수료 체계 개편. 정액에서 건당으로 바뀌자 영세 사장들과 라이더들의 착취 구조가 현실이 됐다. 파란 가방을 멘 기사들이 청계천과 광화문으로 모였고, 가게 앞에는 배민 OUT 현수막이 걸렸다. “우리는 하루 12시간 도로 위를 달린다, 그런데 회사는 더 가져가겠다고 한다.” 회사는 “투명성”을 말했고, 일부 정책을 되돌렸지만 무너진 신뢰는 돌아오지 않았다. 혁신의 아이콘이던 브랜드는 하루아침에 독점·수탈의 상징으로 몰렸다. 광고의 유머와 폰트의 위트는 사라지고, 남은 건 “플랫폼 자본주의의 본색”이라는 비난뿐이었다.

그 와중에 김봉진은 직원들에게 짧은 메일을 남겼다. 제목은 고마웠습니다. “전단지에서 세계 무대까지, 이제는 여러분이 주인공.” 화려한 퇴장도, 카메라 앞 장광설도 없었다. 2021년 그는 대표 자리에서 조용히 물러났다. 회사 복도엔 허전함과 의문이 동시에 떠돌았다. 자발적 결단인가, 구조의 압박인가. 그가 떠난 뒤에도 질문은 끝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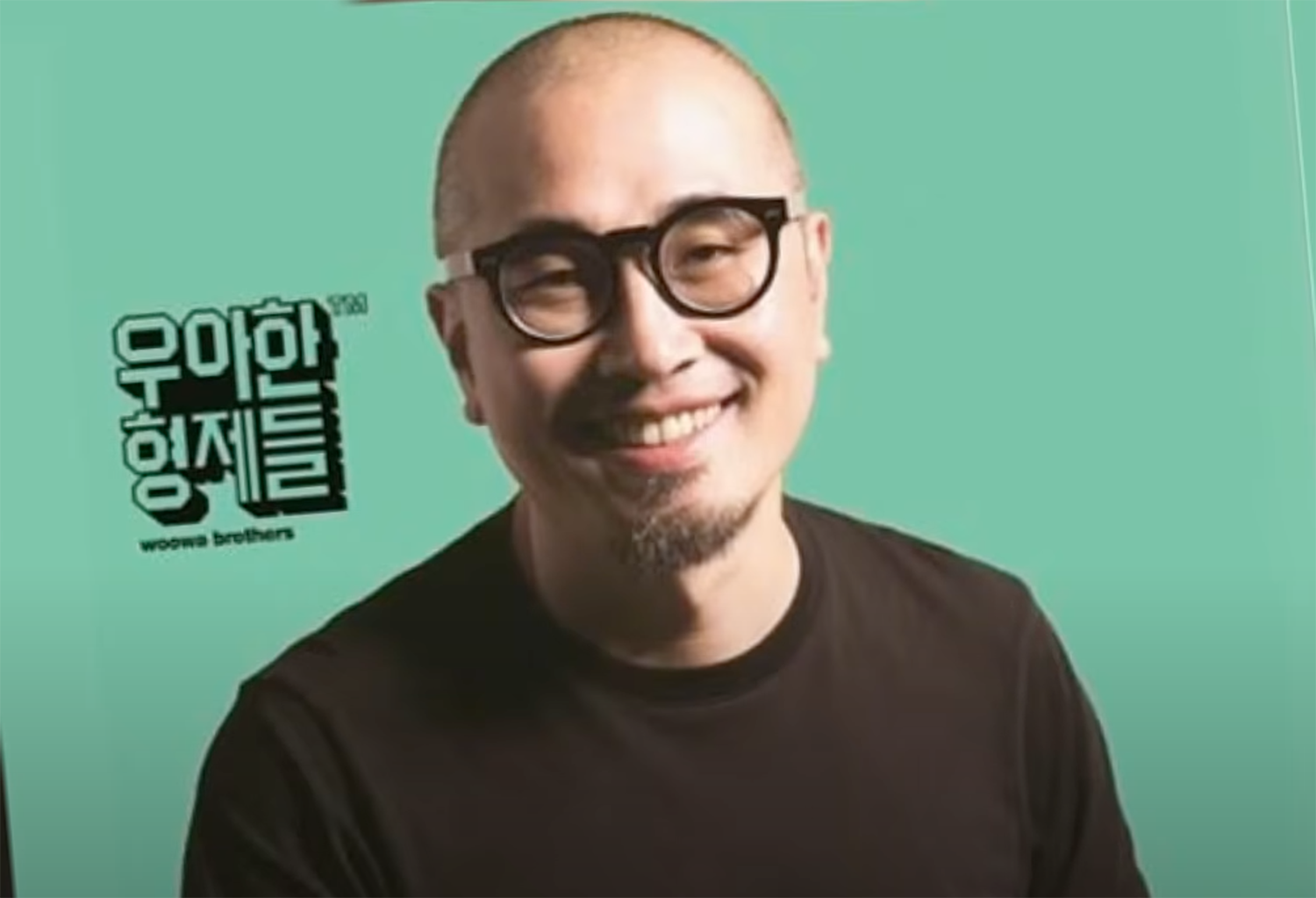
배민은 여전히 시장 1위였지만, 딜리버리히어로의 독점 그림자와 수수료 논쟁은 꼬리표처럼 붙어다녔다. 토종 유니콘을 팔아넘긴 배신자인가,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을 택한 혁신가인가—김봉진의 이름은 양가적 감정의 축에 묶였다. 그는 다른 길을 택했다. 빌게이츠와 워렛버핏이 만든 ‘더 기빙 플레지 서명’, 즉 재산 절반 이상 사회 환원 선언이다. 또한 그는 교육·환경·청년창업 멘토링으로 무게추를 돌렸다. 누군가는 “진짜 책임”이라 박수쳤고, 누군가는 “이미지 세탁”이라 코웃음 쳤다.
지금의 배민은 수수료와 과다한 횡포로 비판에 직면했다. 그날의 빅딜은 ‘혁신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한국 사회 테이블 위에 던졌다. 적어도 수 많은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모두가 ‘당신을 위해서’라는 홍보 카피를 외치지만 그건 오직 미끼에 불과 하다는 사실을 플랫폼에 종속되어 가는 유저들은 깨달아야 한다.
- 지하 경제의 상징 성인 호스트 클럽들이 현재 ‘폭망’중인 이유
- 하룻밤 사이에 70곳이 망했다…중국 자동차의 대재앙이 시작되었다
- 지인 아들과 불륜 저지른 아내 때문에 충격받은 연예인 근황
- 정치인,유명인 아님…일본에서 가장 미움받는 이 평범한 남자
-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줄였더니…대한민국에 결국 대재앙이 왔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