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 때 본사가 손해보고 닭을 팔았다? 43년째 이어진 기적

43년 동안 단 한 번도 본사의 간판을 내리지 않은 치킨집이 있다. 바로 ‘페리카나’다. 수많은 프랜차이즈가 생겨났다 사라지는 치킨 전쟁터에서, 이 브랜드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시작은 1979년, 대전역 앞의 허름한 닭집이었다. 창업주 양희권 씨는 생계를 위해 닭을 튀기기 시작했지만, 곧 문제를 발견했다. “식으면 맛이 없어.” 그 단순한 한마디가 오늘날 ‘양념치킨’이라는 신화를 만들었다. 고추장, 마늘, 양파 등 20여 가지 재료를 직접 배합해 만들어낸 매콤달콤한 양념 소스. 당시엔 없던 ‘맛의 혁명’이었다. 이 양념 하나로 대한민국 치킨의 역사가 갈라졌다.

그는 평범한 치킨집 사장님 아니었다. 바로 광고인 출신이었던 것. 그는 ‘페리 페리 페리카나 ~♬’로 시작되는 중독성 있는 노래로 광고를 직접 제작했다. 전국의 학생들이 이 노래를 따라 부르며 놀던 시절, 페리카나는 이미 하나의 문화였다. 창업 1년 만에 500개 매장이 생겼고, 1세대 치킨 브랜드들이 반 이상 사라진 지금도 전국 매장이 1,000곳이 넘는다.

하지만 진짜 비결은 화려한 광고 때문 만이 아니었다. “점주가 살아야 본사가 산다.”는 그의 철학이다. 페리카나는 성장 속도보다 지속 가능한 ‘상생’을 택했다. 무작정 출점하지 않고 철저히 상권을 분리해 기존 매장의 매출을 보호했다. 또, 위기 때마다 점주를 지켜냈다. 조류독감으로 생닭 가격이 폭등했던 시절, 대부분의 본사가 원가를 떠넘길 때 페리카나는 손해를 감수하며 원가 이하로 공급했다. 그 덕에 수많은 점주들이 폐업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고, 지금까지 2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영업하는 매장들이 즐비하다.

누군가는 말한다. “요즘 누가 양념치킨을 먹냐”고. 하지만, 사람들은 생각보다 더 많이 ‘첫사랑 같은 맛’의 페리카나를 찾는다. 유행은 바뀌어도, 손끝에서 만든 진짜 맛과 사람을 챙기는 철학은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점주들은 떠나지 않는다. 43년의 시간 동안, 이 브랜드는 단 한 번도 ‘가맹점 보호’라는 원칙을 어기지 않았다.

위기의 한국 경기속에서 최근 페리카나는 영업이익이 오히려 4년 연속 성장중이다. 내실을 다지며, 해외 진출에도 힘쓰고 있다. 페리카나의 경영 철학은 가맹 본사의 이익, 단기 수익에 스스로의 생명력을 갉아 먹는 요즘 흔한 프랜차이즈와 크게 비교된다. ‘사람’과 ‘제품’만을 중심에 둔 경영이 결국 가장 오래 살아남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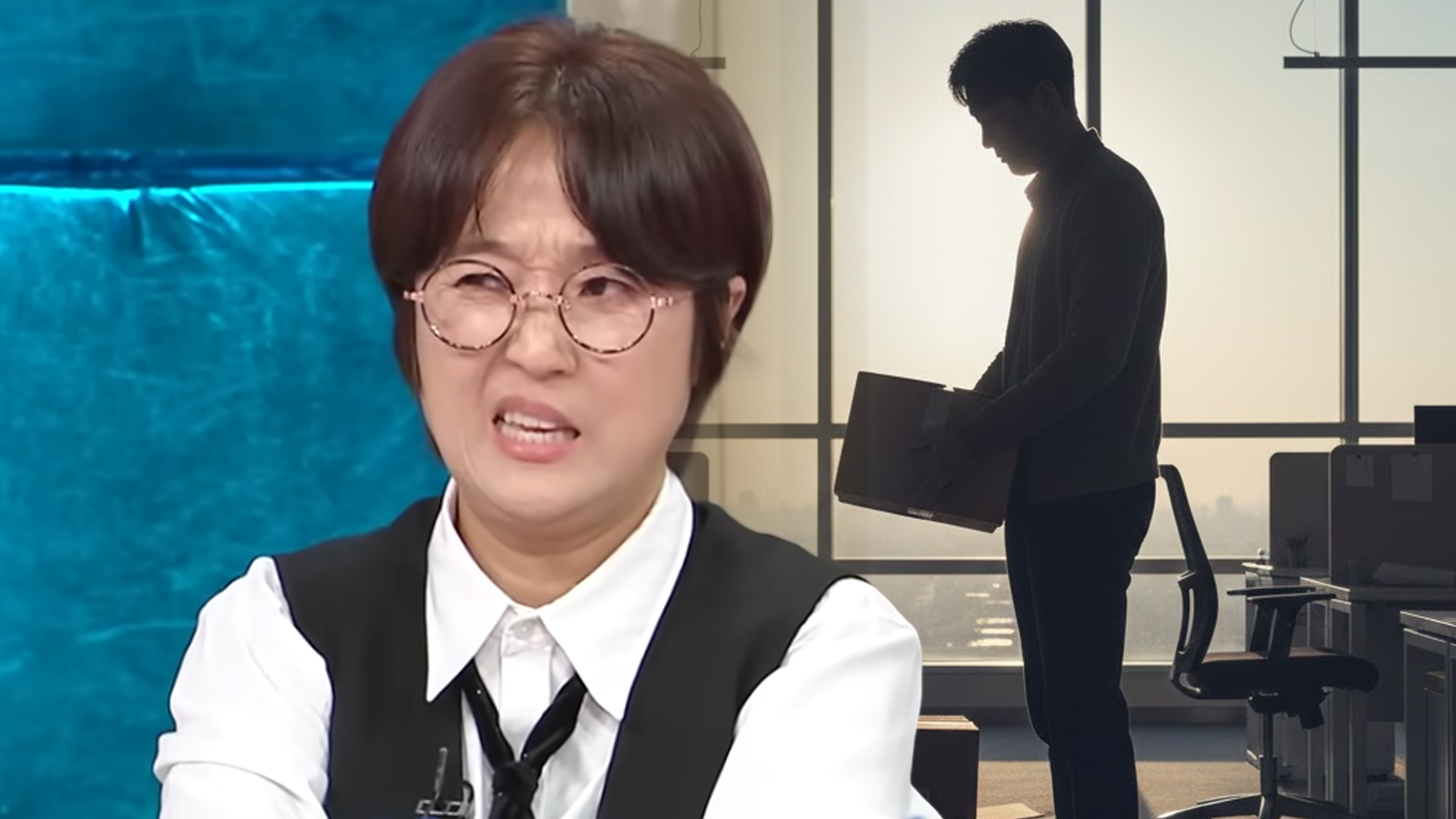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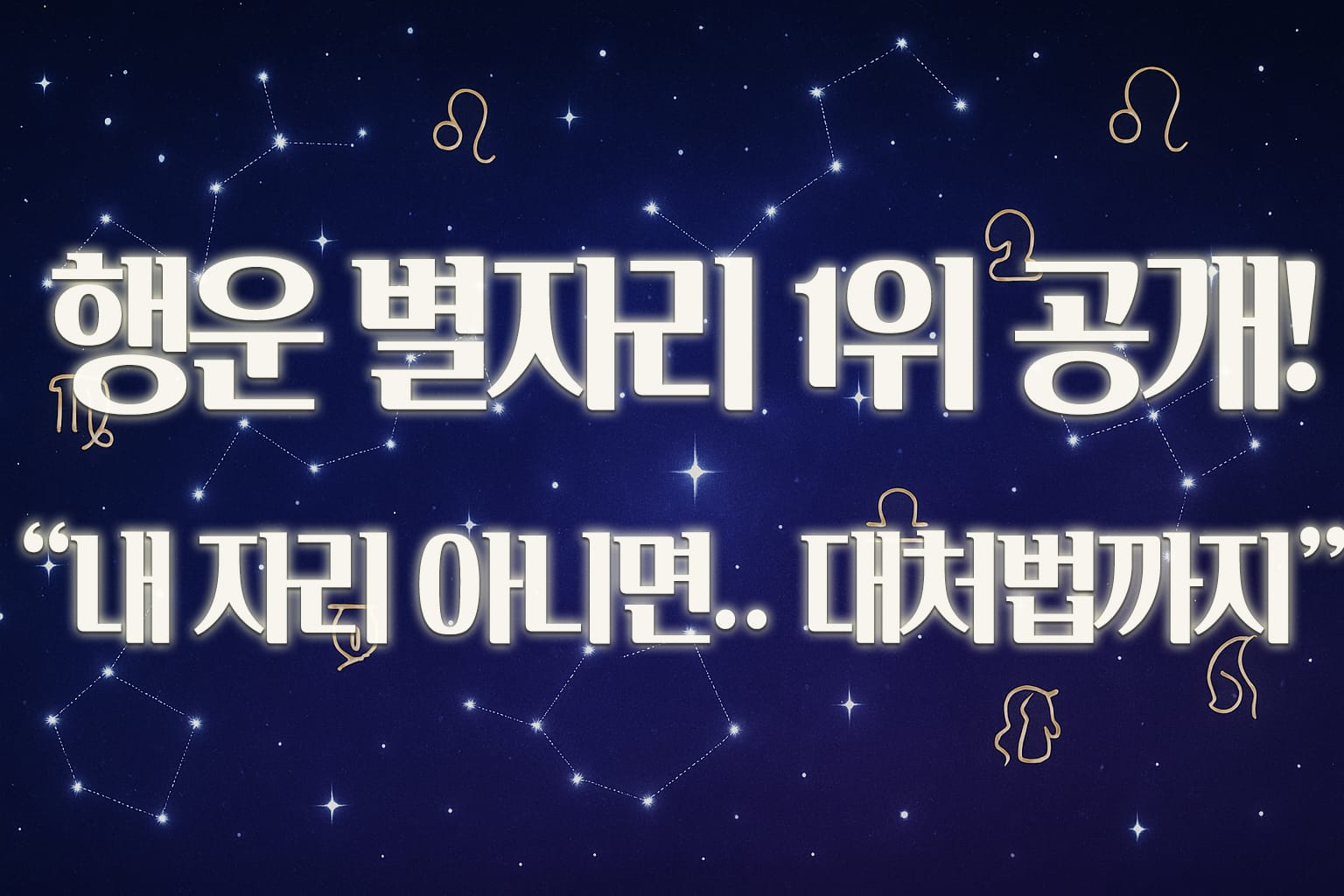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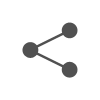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