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30명 사망’ 브라질 역대급 갱단 소탕 작전, 그 이면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한 빈민가가 전쟁터로 변했다. 총성이 쏟아지고, 차량과 건물이 불타며 시신 수십 구가 도로에 나뒹굴었다. 며칠 전 브라질 정부가 단행한 역대 최대 규모의 갱단 소탕 작전 때문이다. 단 하루 동안 숨진 사람만 130여 명에 달했다.
이번 작전의 표적은 브라질 최대 범죄조직인 ‘코만두 베르멜류(Comando Vermelho, 붉은 사령부)’였다. 1970년대 수감자 연합에서 출발한 이 조직은 마약·무기 밀매로 세력을 키워 브라질 전역은 물론 페루, 콜롬비아, 유럽까지 손을 뻗었다. 리우 빈민가(파벨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조직원만 3~4만 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1년 넘게 수사를 준비했고, 마지막 60일 동안 작전 계획을 정밀하게 다듬었다. 투입 병력만 2,500여 명, 기존 대규모 작전의 다섯 배였다. 주지사는 “이제 더는 갱단에 도시를 맡길 수 없다”며 강경 진압을 선언했다. 하지만 경찰과 갱단의 교전 과정에서 드론 폭탄과 방화로 민간 피해가 속출했고, 학교와 기업이 문을 닫는 등 도시 전체가 마비됐다.

정치적 의도도 짙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브라질은 ‘치안 회복’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이다. 게다가 COP30 기후 정상회의, C40 시장 포럼 등 국제 행사를 앞둔 시점에 정부는 “국가 이미지 회복”을 내세워 대대적인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미국의 단속 강화로 남미 마약 유통로가 위축되자, 그 공백을 메우려는 갱단의 확장을 선제 차단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하지만 공권력 남용 논란도 거세다. 시민 수백 명이 흰 옷과 ‘붉은 손자국 깃발’을 들고 거리로 나와 “무고한 민간인을 희생시킨 학살”이라며 항의했다. 유엔 사무총장 역시 “과도한 희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현지 여론은 “갱단을 방치하면 더 큰 참사가 온다”며 정부의 강경 대응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유통망이 마비되겠지만, 지휘부가 아닌 하위 조직만 타격해 곧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실제 리우에서 매년 진행되는 1,800여 건의 경찰 작전 중 실질적 성과는 1%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다.
이번 ‘붉은 사령부’ 소탕전은 브라질의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알린 신호탄이다. 그러나 그것이 정의의 승리로 끝날지, 또 다른 폭력의 불씨로 남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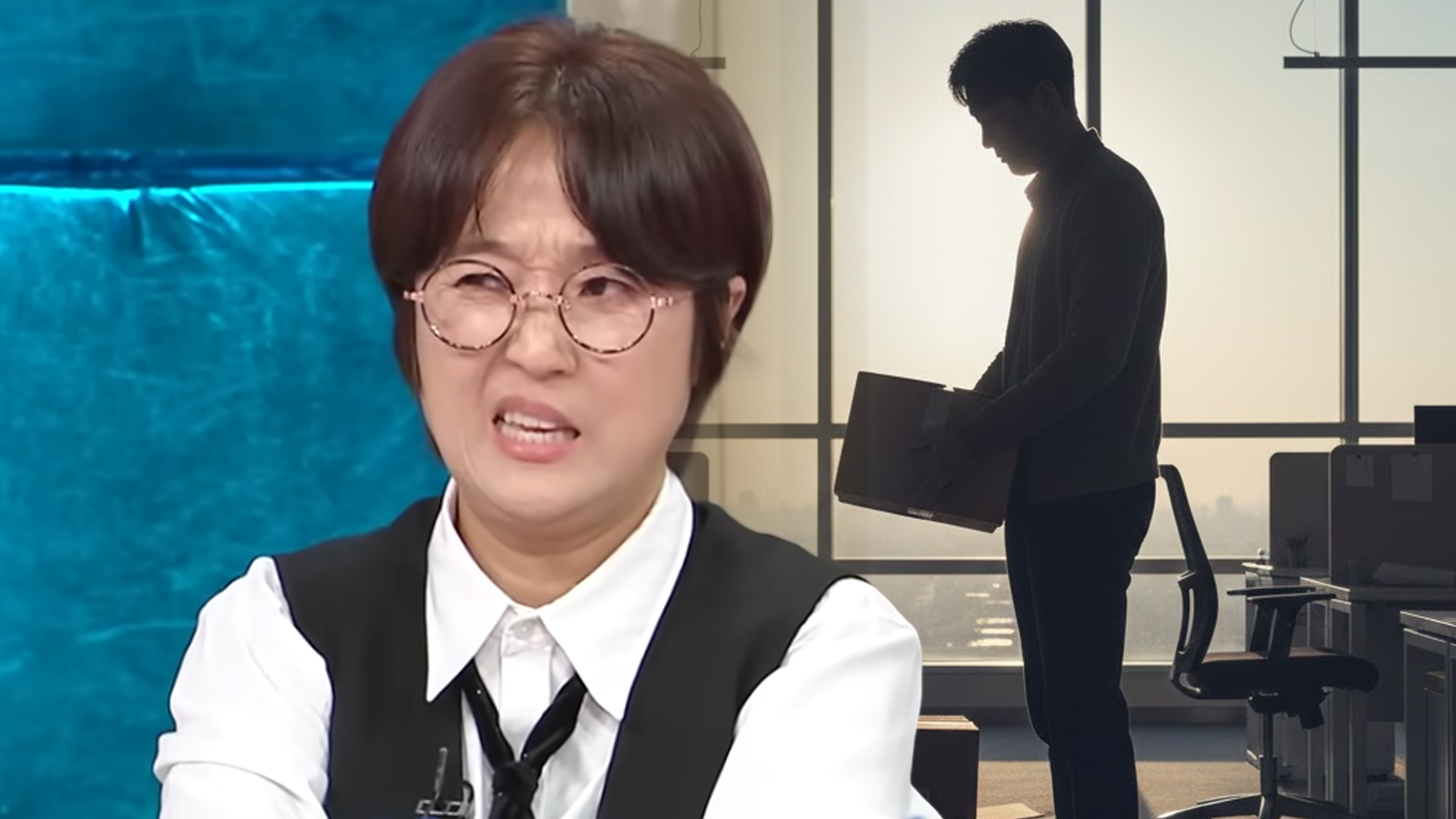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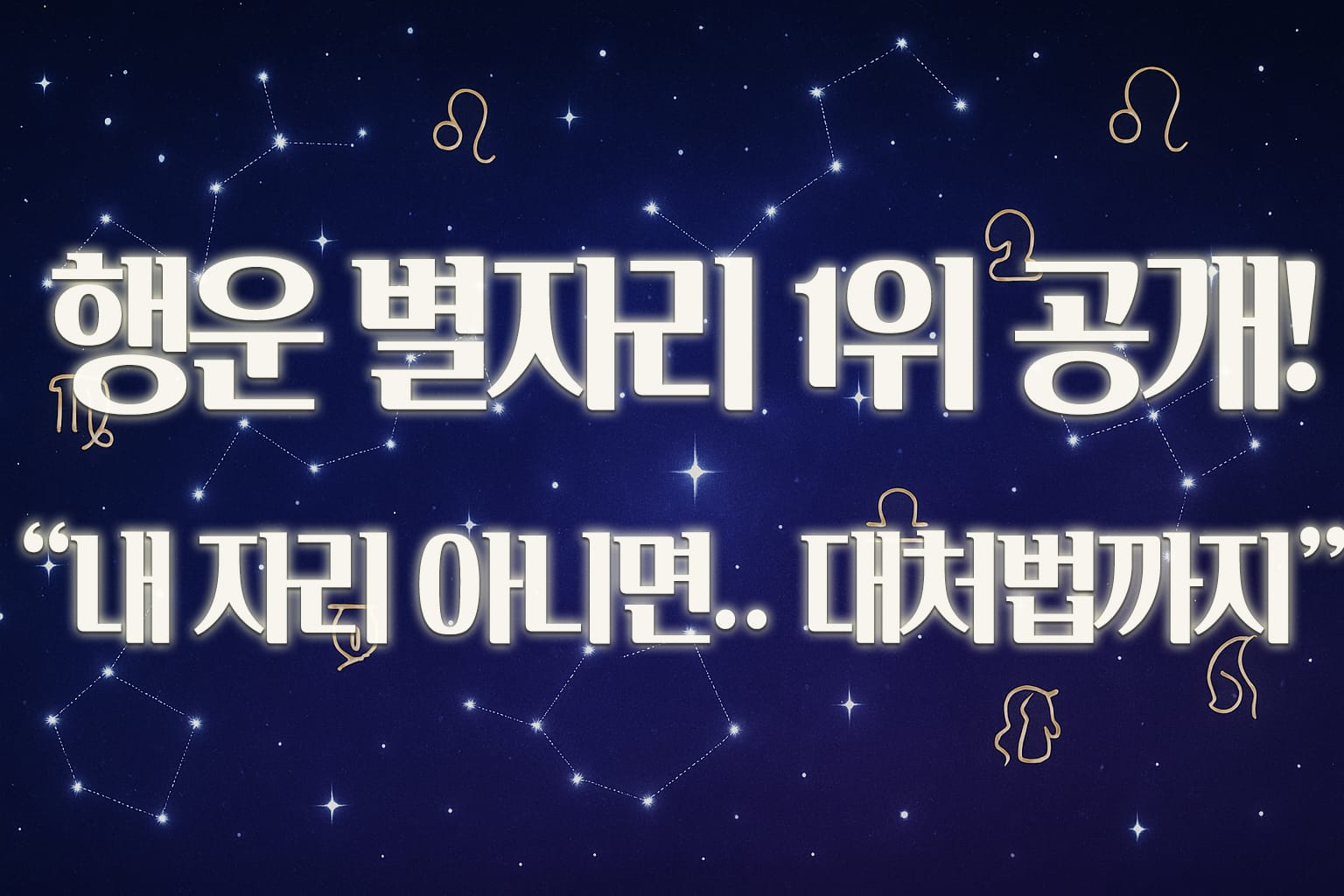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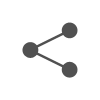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