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운항부터 적자 폭증…철회권 없는 제주도, 손실은 무조건 우리가 낸다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국제 화물 항로가 57년 만에 처음 열렸다는 소식은 처음엔 “드디어 제주도도 국제 물류 시대를 열었다”는 희망찬 현장 분위기와 함께 출발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자마자 반전이 터졌다. 기대와 달리 물동량은 첫 주부터 심각하게 부족했고, 결국 도민 세금으로 보전해야 하는 손실 규모가 첫 지급부터 4억 원대에 달하는 상황이 현실로 나타났다. 이제 막 첫 발을 뗀 항로가 제주 경제의 새로운 길을 여는 상징이어야 했지만, 실제 구조를 보면 한쪽으로 기울어진 불평등 계약만 남아 있었다.

제주도와 중국 선사 간 협정에 따르면, 운항을 철회할 권한은 오직 중국 선사에게만 있다. 제주도는 적자를 메꿔주는 의무를 지지만, 항로 유지 여부를 선택할 권한조차 없다. 적재 용량 712TEU짜리 화물선이지만, 첫 주 실적은 수입 38개, 수출 6개. 이후 12개·1개·2개로 추락했다. 사실상 “빈 배로 오가며 도민 혈세를 태우는 구조”가 그대로 방치된 셈이다.
수입 품목은 패트칩, 어망, 석재 정도. 수출은 가공식품과 냉동 고등어가 전부였다. 기존 물류 네트워크가 이미 안정돼 있는 제주에서 단기간에 신규 물류량을 만들어내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물동량 확보’를 약속했고, 그 이행 실패에 대해선 고스란히 손실 보전이라는 비용으로 책임을 지는 모양새가 됐다.

핵심 문제는 단순한 적자 문제가 아니다. 계약 구조가 제주도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이 폭발적인 민심 반발을 만들고 있다. 항로 유지 실패 시의 철회 권한은 중국 측이 독점하고, 제주도는 손실을 떠안는 조건이라는 사실이 공개되자 “왜 이런 협정을 체결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도민 세금으로 수억 원을 떠안는 구조에서, 정작 철회 버튼은 제주가 아니라 중국 선사만 쥐고 있는 상황. 공공 협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기형적 계약이다.
한 달도 안 된 항로가 이제 제주도의 미래 먹거리를 열어줄 기반이 될지, 아니면 값비싼 ‘실험’으로 끝날지는 더 이상 물동량 문제가 아니다. 애초에 계약 자체가 제주를 무력하게 묶어두는 방식으로 설계된 이상, 제주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손실 보전과 추가 부담뿐이다. 도민 경제를 살리겠다며 출발한 항로가, 정작 도민에게는 떠밀린 의무와 빚만 남기는 구조로 굳어지기 전에 계약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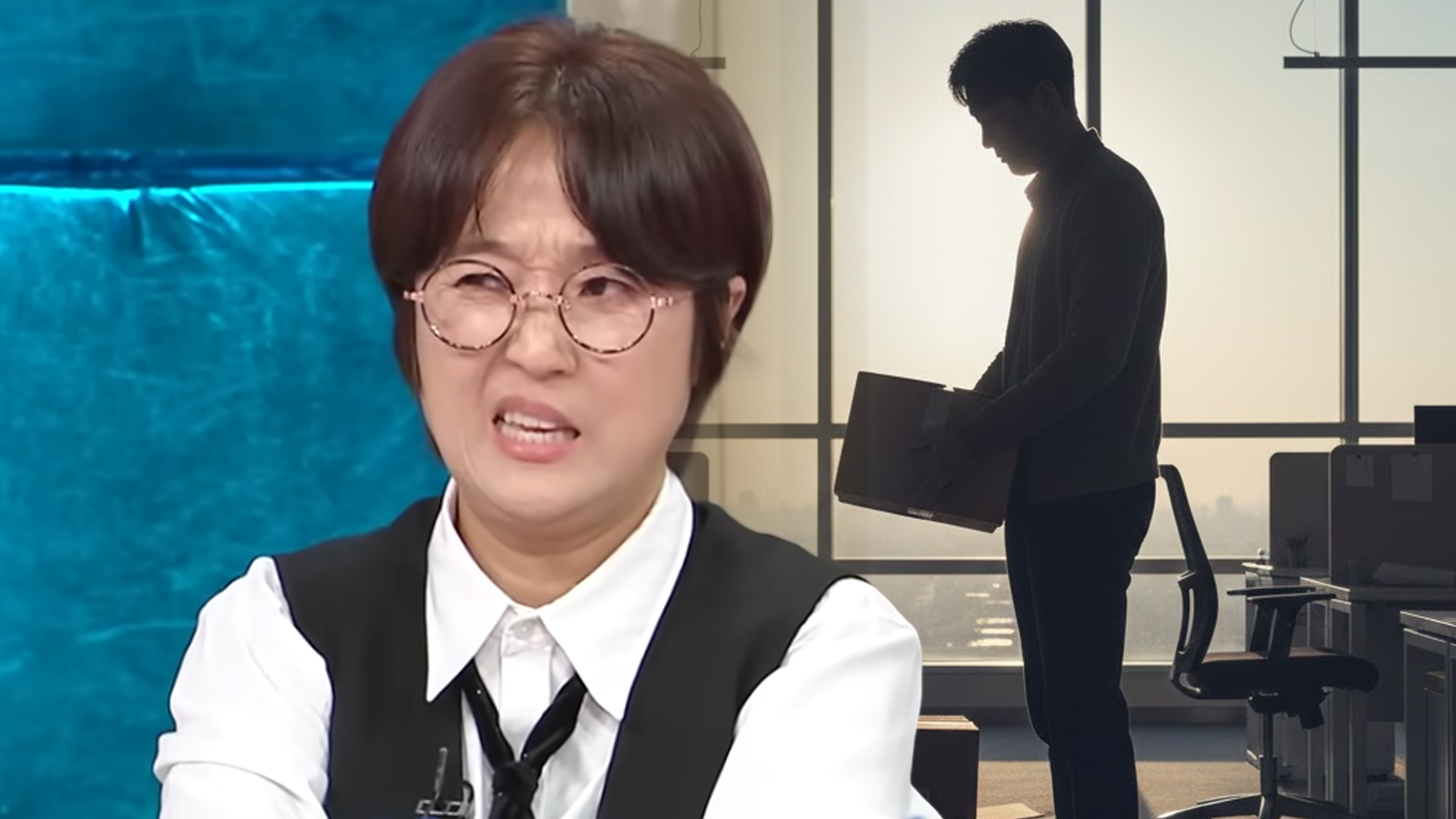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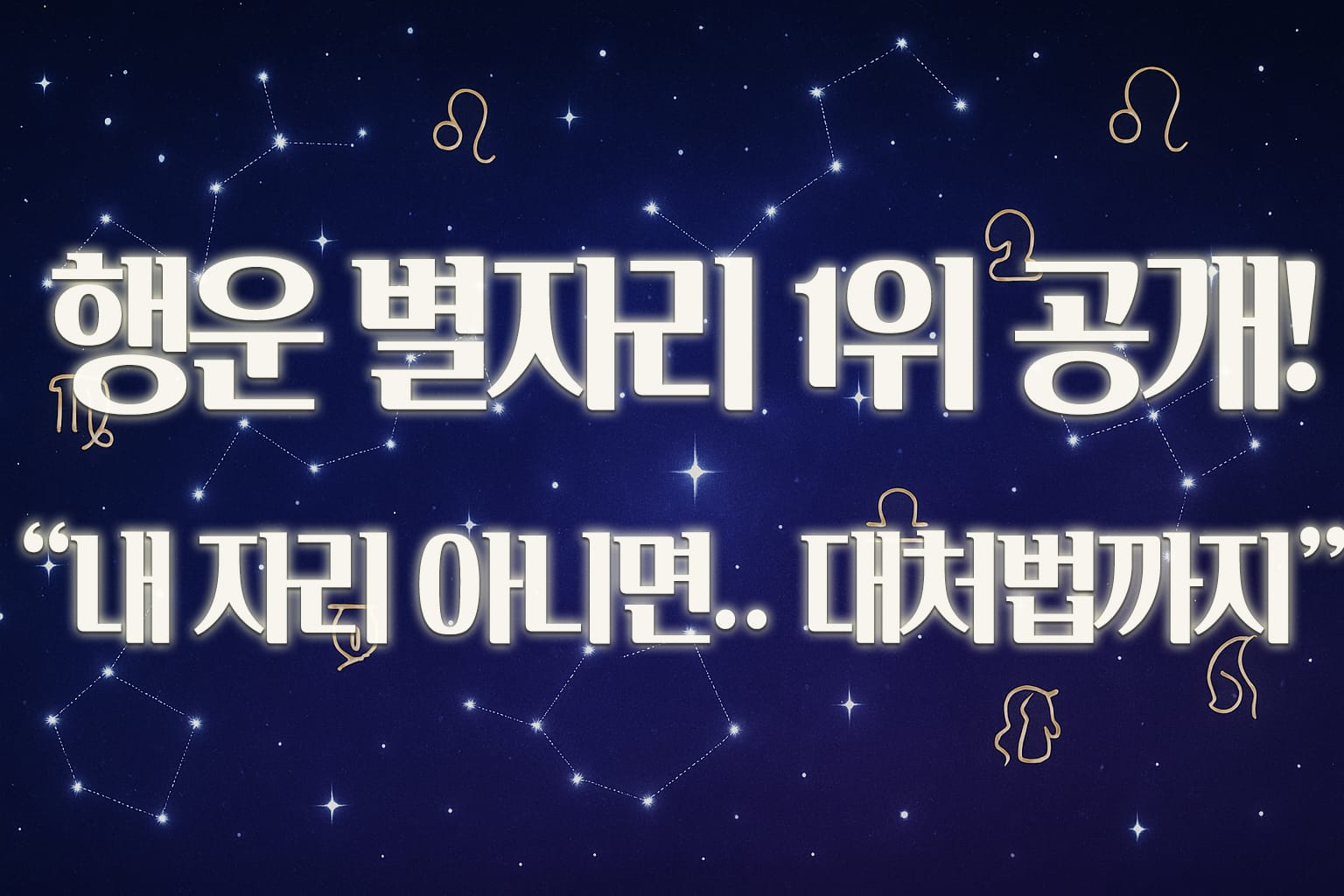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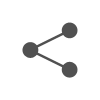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