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보다 룰이 문제다 — 한미 경제 협상의 숨은 변수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500조 원 투자금이 결국 ‘액수 삭감’과 ‘8년 분납’으로 타협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엔 3,500억 달러(약 500조 원)를 “선불로 내라”고 압박했지만, 협상 끝에 한국이 매년 250억 달러씩 8년 동안 나눠 투자하는 안으로 조정된 것이다. 그래도 총액은 2,000억 달러, 여전히 한국 외환시장엔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핵심 쟁점은 돈을 얼마나 내느냐보다, 수익을 누가 가져가느냐였다. 미국은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입장이었고, 한국은 “투자금 회수 전까지는 최소한 90%를 확보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다시 워싱턴을 찾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협상이 쉽게 끝나지 않자 양국은 ‘돈 대신 기간을 늘리는 절충안’을 택한 셈이다.

트럼프는 오는 29~30일 한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그는 일본과의 회담에서 대규모 투자 유치 성과를 과시하려는 계획을 세워뒀고, 한국과의 협상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정치적 시점에 맞춰 서두르지 않겠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미국의 속내는 다르다. 트럼프가 대선 국면에서 ‘미국 일자리와 투자 성과’를 강조하려는 만큼, 한국의 결정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정치 변수로도 얽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무리한 퍼주기는 없다”고 못 박았고, 경제팀에도 “성과보다 안정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협상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김용범 실장은 “계속 만나는 것 자체가 진전”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미국이 완강하다”는 표현도 덧붙였다. 미국은 여전히 대규모 투자와 공동 기술개발, 반도체 공급망 참여를 패키지로 요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번 합의는 ‘투자 총액을 줄이는 대신,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절충형 딜’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돈보다 이익 배분 구조와 기술권한이다. 만약 미국이 수익 대부분을 가져가면 한국은 ‘투자국’이 아니라 ‘하청국’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외교적 균형 감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재명 정부는 “성과보다 구조”를 택한 셈이다. 단기적으로는 트럼프의 요구를 피했지만, 장기적으로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 안에서 한국의 자율성이 어디까지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협상 테이블 위 숫자보다 중요한 건 누가 룰을 정하느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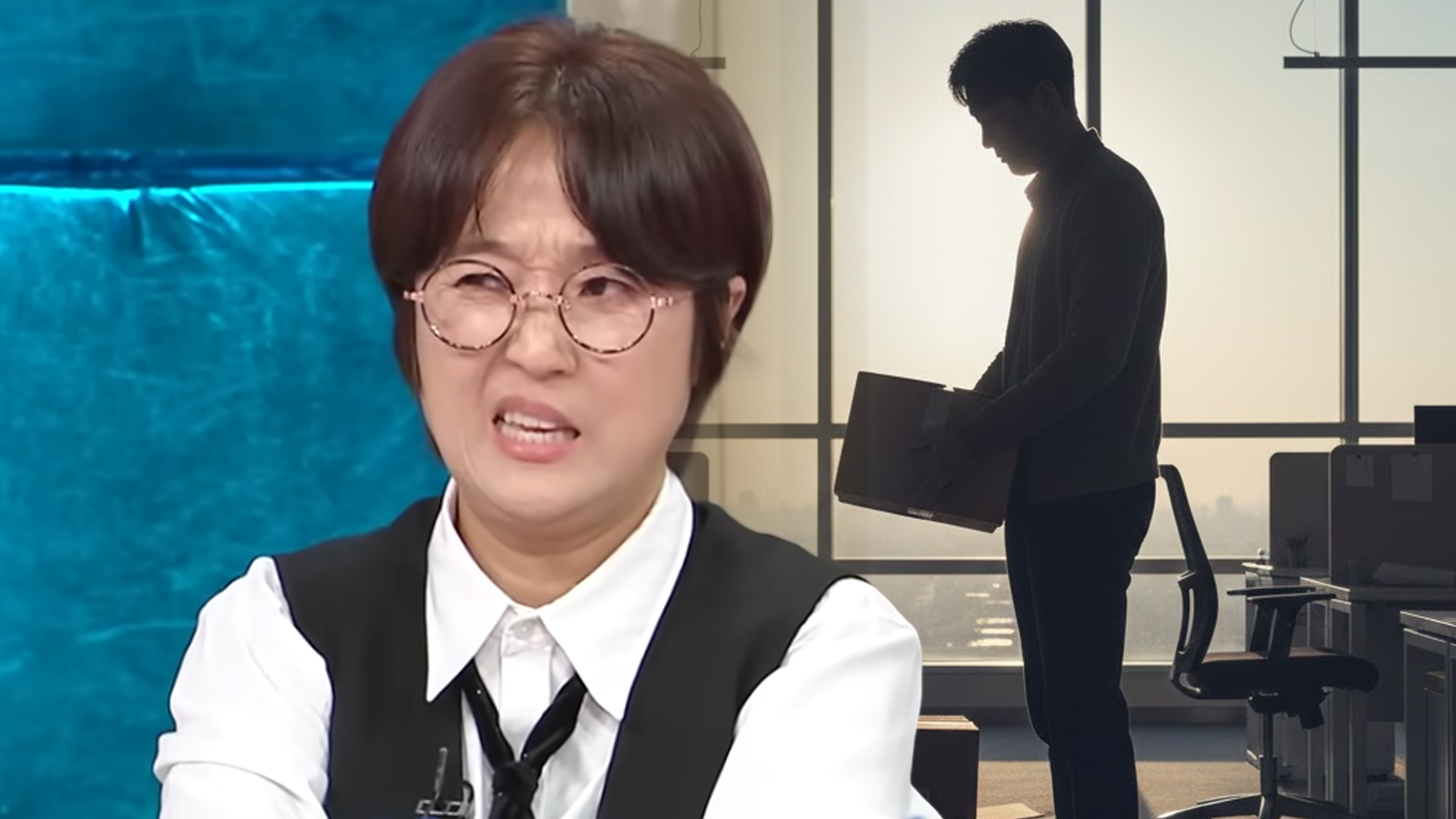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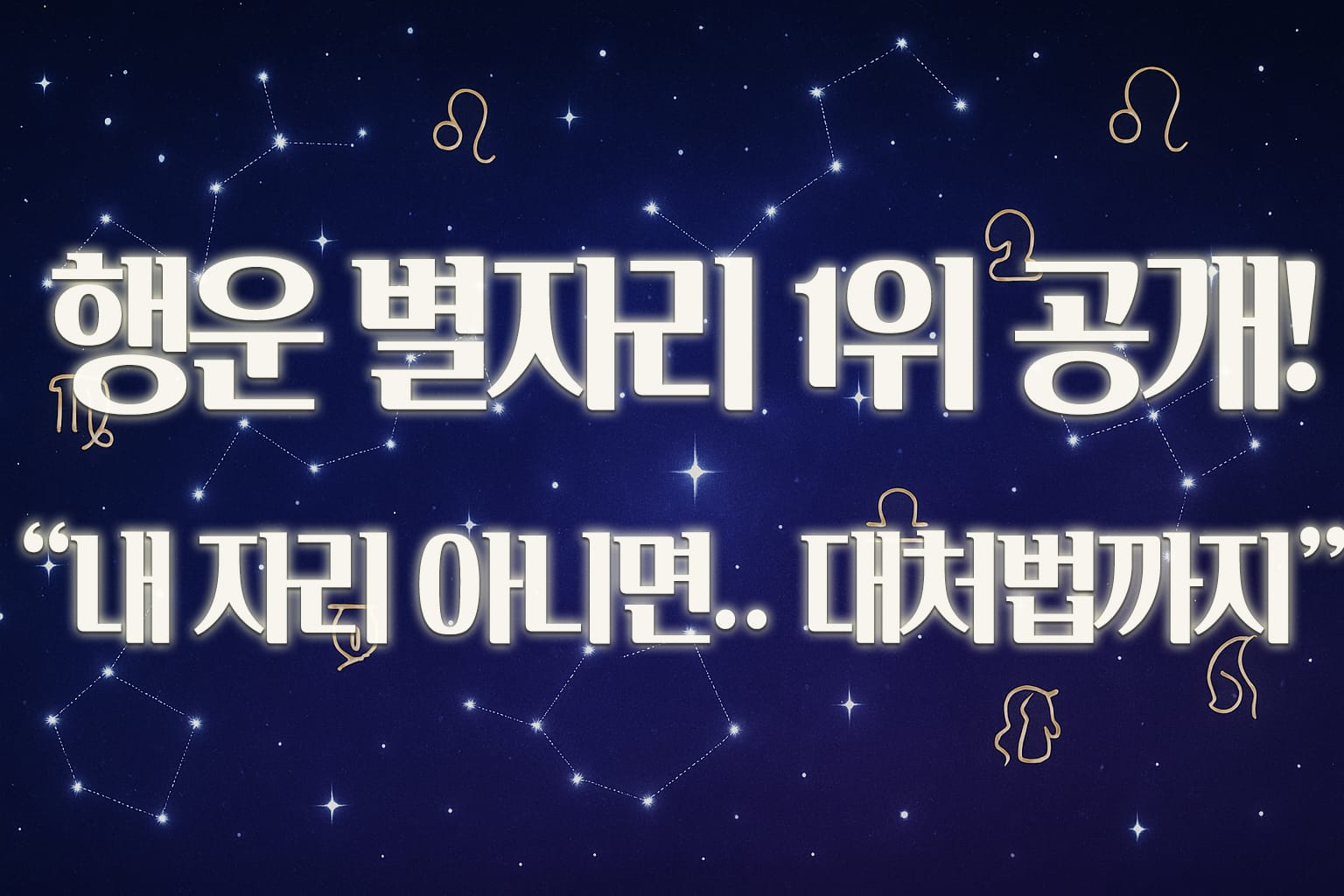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